AI 시대, 여전히 ‘만드는 즐거움’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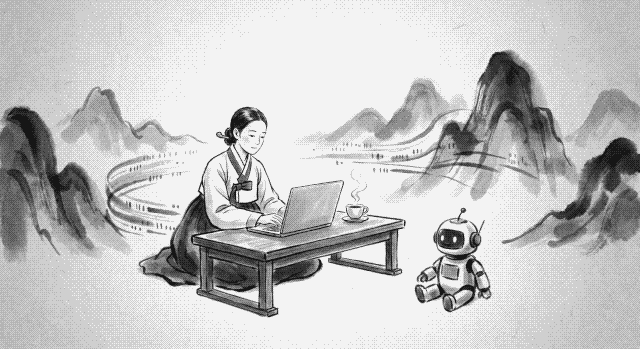
기계가 더 빨리 해낼 수 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만드는 이유.#
저는 글 끄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말랑말랑하게 풀어낼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즐깁니다. 비록 ‘개발자 그림’ 수준의 아마추어 실력이지만, 백 마디 말보다 깔끔한 다이어그램 하나가 훨씬 강력하다고 믿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코딩을 사랑합니다. 내 손끝에서 무언가 실제로 작동하는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정말 좋아합니다.
생성형 AI의 거대한 파도에 발을 담근 건 2023년, Stable Diffusion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전부터 게임 AI 쪽을 기웃거리긴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시작된 변화가 모든 IT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서양 화풍 위주로 학습된 모델들에 묘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접 데이터셋을 깎아 만들고, 조선의 화가 신윤복의 붓터치를 AI에게 가르치는 재미에 한동안 푹 빠져 지냈죠.
그러다 문득, 너무나도 손쉽게 쏟아져 나오는 고퀄리티 이미지들 앞에서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압도감 속에서도 저를 지탱해 준 건, ‘새로운 화풍을 가르치고 방향을 잡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비슷한 무력감은 글쓰기에서도 찾아왔습니다. ChatGPT를 거쳐 Gemini에서 진화하는 모델들을 보며, AI의 작문 실력이 저를 훌쩍 뛰어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엇을 쓸지 주제를 정하고, 제 이름으로 발행되는 글의 무게를 견디며 마침표를 찍는 건 ‘나’라는 점, 그 책임감만큼은 AI가 가져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코딩이라고 다를까요. 아직은 제가 직접 타이핑하는 비중이 높지만,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그 진화 속도에 입이 떡 벌어지곤 합니다.
이미 글이나 그림은 저보다 AI가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친 초안을 던져주면 AI가 매끄럽게 다듬고, 제가 최종 검수와 조정을 하는 협업 프로세스가 제 일상에 정착되었습니다. 모델이 똑똑해질수록 제가 손대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머지않아 코딩 또한 이 프로세스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어제 참여한 AI 워크샵에서 누군가 제게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래에 인간은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이 AI에 의해 자동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비록 AI라는 강력한 도구의 힘을 빌리더라도, 그 창조의 시작점과 의도는 여전히 ‘사람’에게 있을 테니까요.
AI가 스스로 만들고 싶어서 생성한 것과,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은 분명 구별될 것이고 그 가치 또한 다르게 매겨질 것입니다.
마치 의자가 하나 필요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다양한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물론 돈만 지불하고 편하게 완제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케아에서 부품을 사와 직접 조립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누군가는 도구를 갖추고 목재를 재단해 처음부터 만들기도 하며, 또 누군가는 정말 원초적으로 돌아가 손으로 한 땀 한 땀 나무를 깎는 수고로움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낸 기성품과 장인의 수공예품에 각기 다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미래의 우리도 그저 결과물에 담긴 ‘과정’과 ‘가치’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게 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